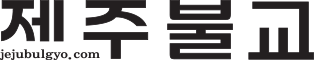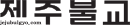고려시대 건축사 연구에 큰 영향 미칠듯

제주시 오등동 옛 절터에서 지난달 25일 금동다층소탑과 동전, 자기류, 기와 등 고려시대 유물이 발굴됐다.
재)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은 제주시 오등동 250-8번지 창고 시설부지 일원 유적 발굴 조사를 통해 구전으로 전해오던 고려시대 제주에 있었던 ‘오등동 절터’에 대한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등동 절터’는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고려시대 사찰터로 예로부터 ‘절왓’, 또는 ‘불탄터’로 불린 곳인데, 이번에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전해져오던 ‘오등동 절터’의 가치와 창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 오등동 폐사지(건물 5동)에서 발굴된 출토유물은 자기류와 기와류, 화폐, 철제품, 금동다층소탑 등이 출토되었으며, 기와류가 가장 많이 발굴되었다.
자기류는 강진 고려청자요지에서 생산된 양질청자와 조선시대(15~16세기) 분청사기 등 다양한 자기류가 출토되었고, 화폐는 함평원보(咸平元寶), 황송통보(皇宋通寶), 치평원보(治平元寶)다. 여기서 함평통보는 중국 송진종 함평년간(998~1003)에 주조된 화폐이다. 황송통보는 송 인종 보원(寶元)년간 (1038~1040)주조된 것이다.

건물지 출토 기와를 통해서는 역사적 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大○’, ‘藍造’, ‘同願此’ 등으로 유적에서 보이는 명문기와는 과거 제주 목관아지유적과 제주성 운주당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으며 세종 17년(1435년) 고득종의 「홍화각기」 에 기록된 내용(‘관우의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려고 폐허가 되어버린 절의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처하는 집을 일으켰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었다.

또 출토된 금동다층소탑은 고려시대 이후 사라진 목탑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지붕과 1개 층 이상의 구조가 잘 남아 있으므로, 당시의 건축양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금동다층소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1915년 구입 후 소장되어 있는 금동9층소탑이 대표적이나 대부분 청동다층소탑으로 출토지를 알 수 없는 자료뿐 인데 이번에 출토된 금동다층소탑의 시기를 알 수 있으며, 출토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건물 5동을 통해 제주사찰의 가람배치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건물지 내부에서는 석조화덕을 사용한 입식구조 및 아궁이와 고래, 구들을 사용한 좌식구조가 동시에 확인되었다. 또한 건물지 출토 명문 기와를 통해 역사적 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고, 금동다층소탑의 출토로 고려시대 건물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그간 ‘오등동 절터’로만 알려져 왔던 고려시대 사찰 관련 유적의 실체적 윤곽이 드러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지 주변의 역사 유적지로는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오등동 절터와 조선시대 남학당지 그리고 죽성 설새밋당과 열녀비, 하잣성 등이 있는데, 이번 발굴조사는 향후 문화재청의 평가 후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